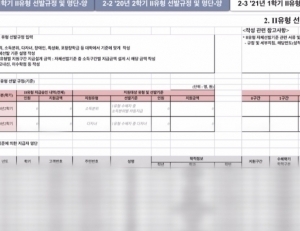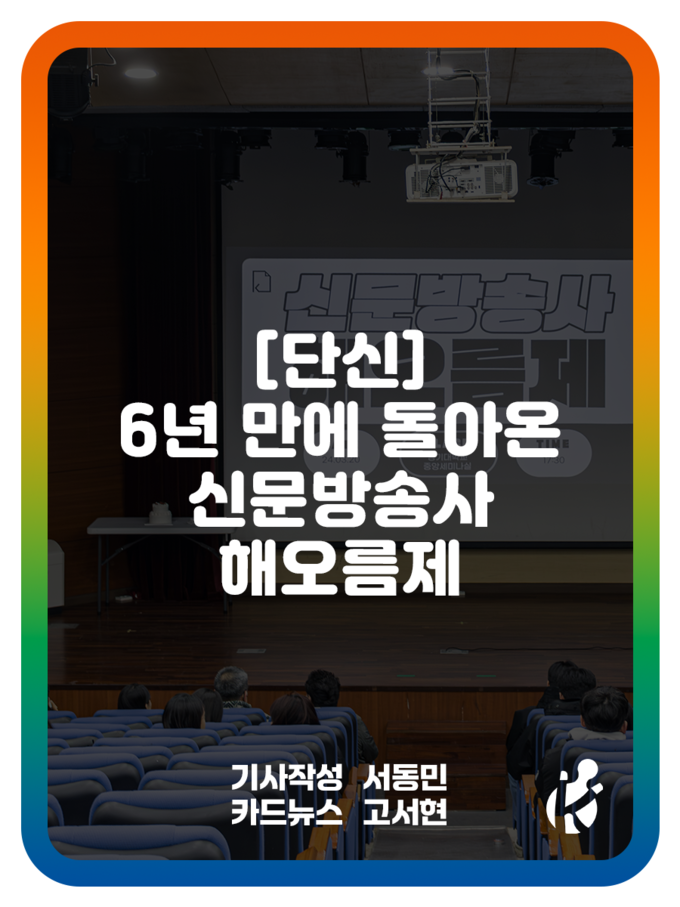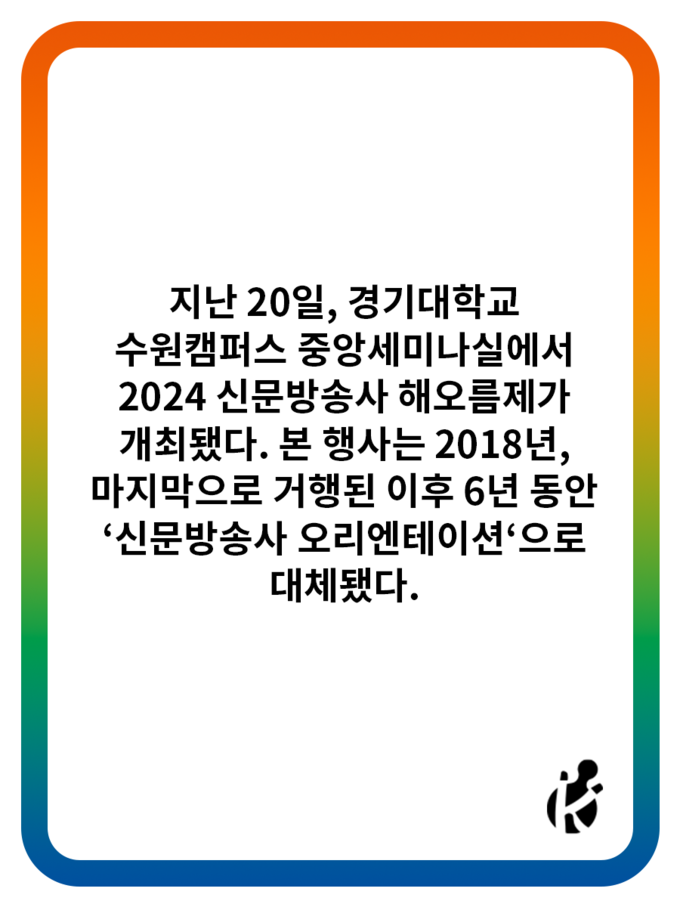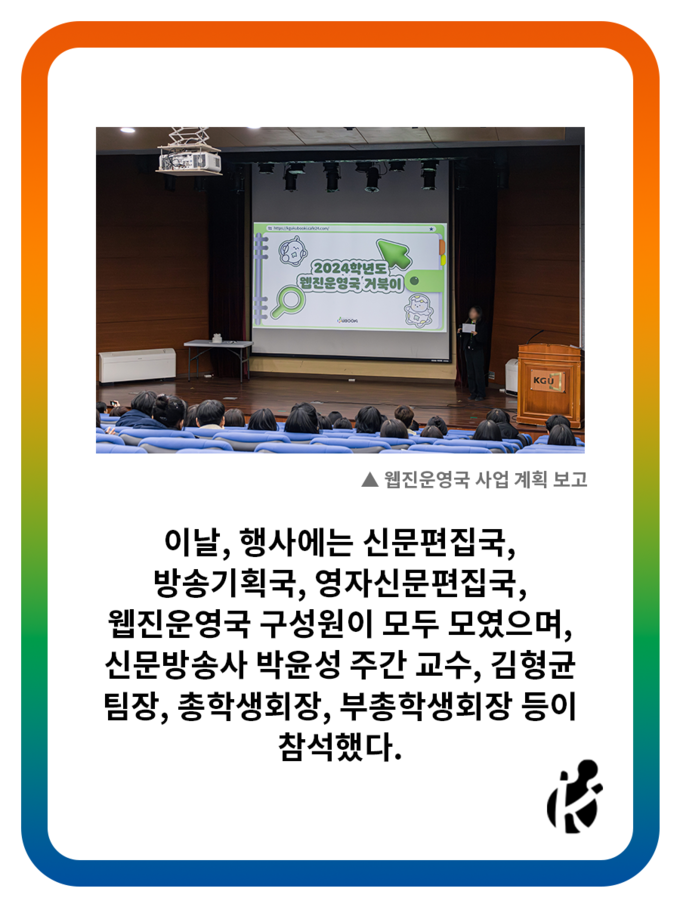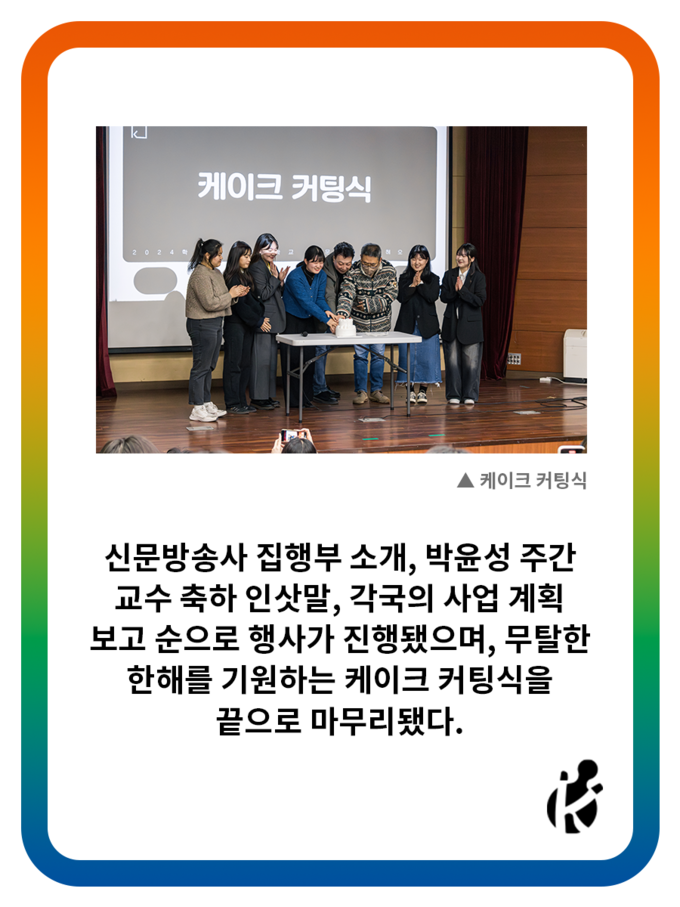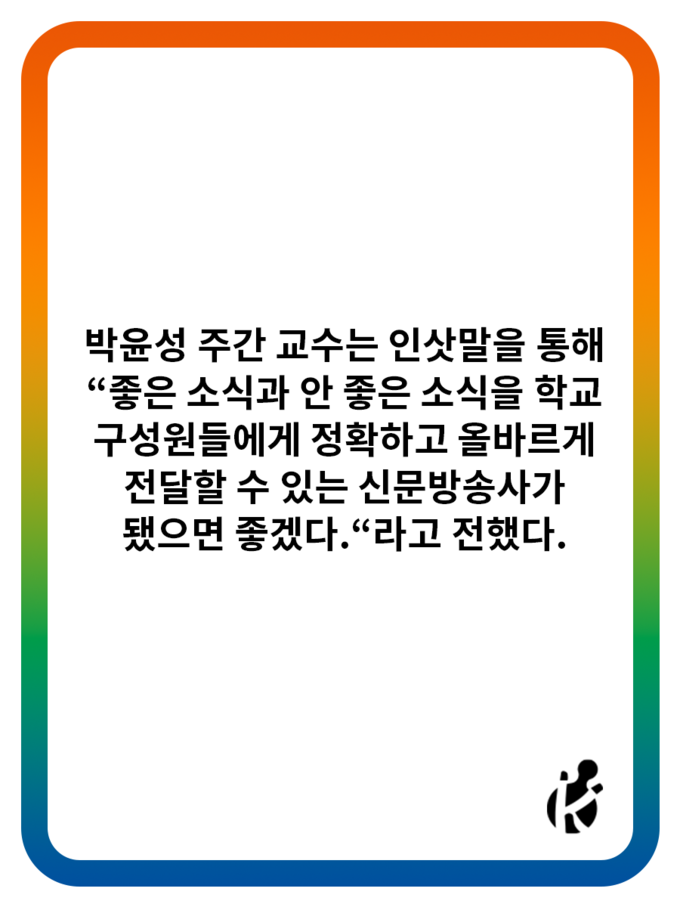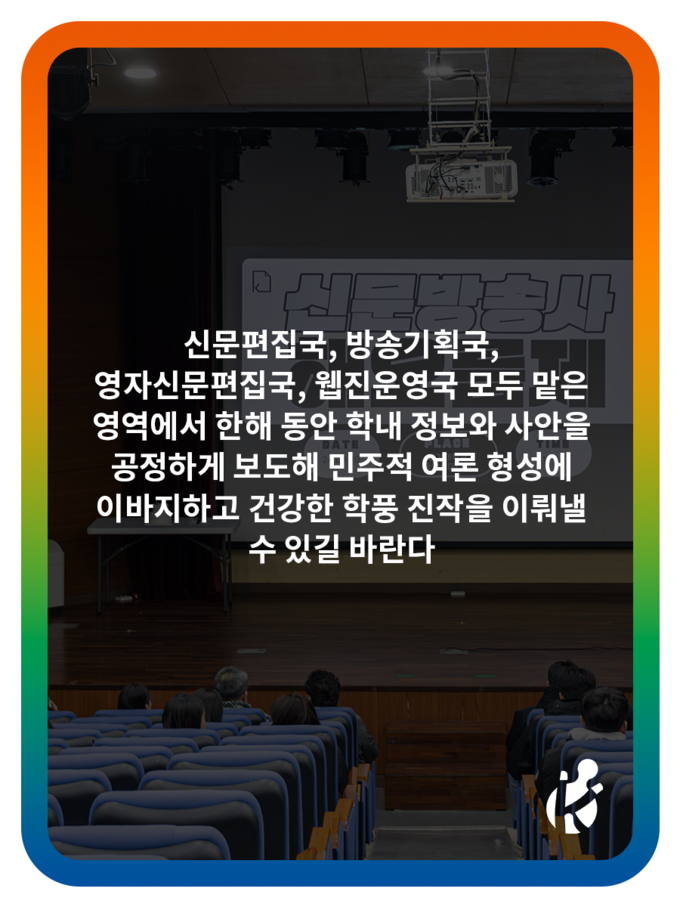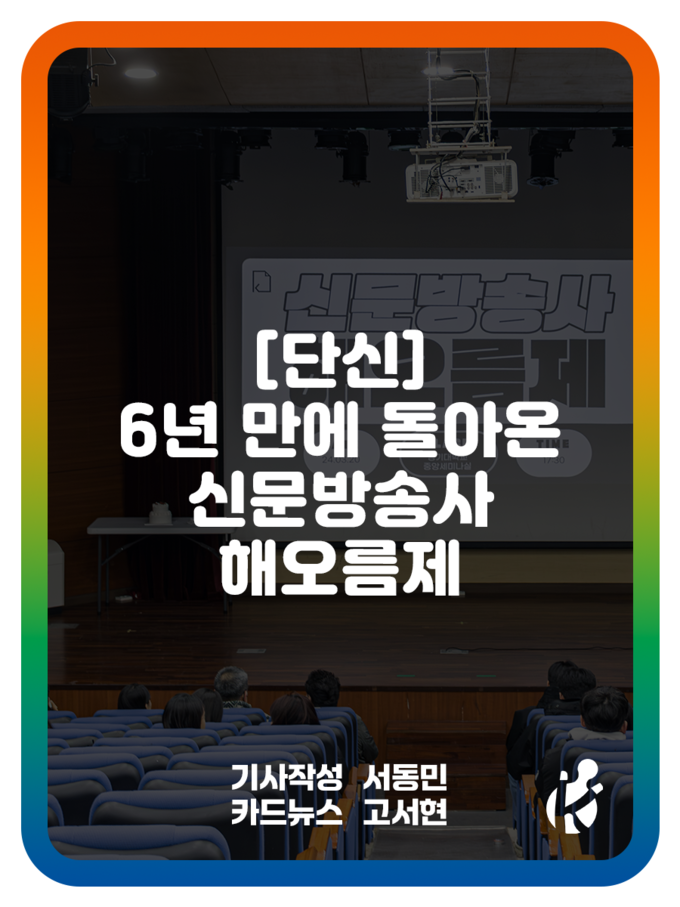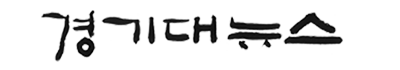기자의 책상에는 두 개의 명함곽이 있다. 하나는 경기대신문 기자 명함, 나머지 하나는 3년 전에 받은 경기도 청소년기자단 명함이다. 경기도 청소년기자단 시절의 나는 기자라기보다는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돼있는 미아에 가까웠다. 거절이 두려워서 말을 걸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시회 취재에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안내원에게만 인터뷰를 부탁하는 정도였다. 그렇다보니 활동을 하면 할수록 내가 기자 활동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케이스 하나를 가득 채운 명함만 남기고 꿈을 잃었다. 그러고는 혼자 글을 쓰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막상 입학한 대학에서 문학상 접수 대자보보다 먼저 눈에 띈 대자보의 문구는 ‘경기대 신문사 2017년 1차 수습기자 모집’이었다. 한번 포기했지만 10년 가까이 꿈꿔온 자리였기에 신문편집국에 입사했다. 그 뒤 5개월이 지났고 성격이 바뀌었다. 거절을 두려워했던 기자는 이제 취재원이 10번 넘게 전화를 받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게 됐다. 휴대전화를 던지고 싶었지만 그만둘 순 없었다. 맡은 지면에 백지를 냈다간 바로 해임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다음 날 저녁까지 전화를 건 끝에 섭외에 성공했고, 인터뷰 기사는 무사히 개강호에 실릴 수 있었다. 그 일 덕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부탁하는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신문사 기자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신문사에 들어온 후 인생 최고의 동료라고 말할 수 있는 학과 동기들을 1주에 한 번 정도 밖에 볼 수 없게 됐고 병원을 찾는 횟수가 고3 때와 비슷해졌다. 그렇다보니 밀려드는 일에 가끔 기사작성이 귀찮아지거나, 도저히 취재를 못나갈 것처럼 힘든 날이 있다. 그런 날엔 3년 전의 청소년기자단 명함을 꺼내서 물어본다. “저 때로 돌아가고 싶니?”. 전혀 아니다. 하지만 맡은 일을 똑바로 못하다 보면 그 시절로 퇴보하는 건 한순간일 것이다. 포기했던 꿈을 적잖은 힘을 들여 되찾았는데 다시 뒷걸음질치긴 싫어서 키보드 앞에 앉게 된다. 3 년 전 꿈을 놓게 만든 명함 몇백 장은 지금의 꿈을 붙잡는 글러브가 됐다. 그때 회피했던 문제를 올해엔 마주봤다. 덕분에 나는 기자다운 기자로 커가고 있다.
- TAG
-
 What Happened in KGU? :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편
On April 4th, a general meeting of students was held in the Tele-convention center at the Suwon campus. The conten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meeting of students in the Seoul campus: the first part was for agenda announcement, the second part was about the Membership Training for whole university, and the third part was simple Q&A time. In the first part, the agendas were all the same as the ones for the Seoul campus, and the result of the ...
What Happened in KGU? :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편
On April 4th, a general meeting of students was held in the Tele-convention center at the Suwon campus. The conten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meeting of students in the Seoul campus: the first part was for agenda announcement, the second part was about the Membership Training for whole university, and the third part was simple Q&A time. In the first part, the agendas were all the same as the ones for the Seoul campus, and the result of the ...

 [타 대학보 축사] 경기대신문의 1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타 대학보 축사] 경기대신문의 1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이파이]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과대포장 규제 정책 시행은 언제쯤
[와이파이]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과대포장 규제 정책 시행은 언제쯤
 [문화산책] 이 세계는 멋져 보이지만 모두 환상이야
[문화산책] 이 세계는 멋져 보이지만 모두 환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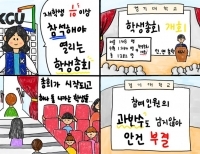 [네컷만화] 학생총회
[네컷만화] 학생총회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