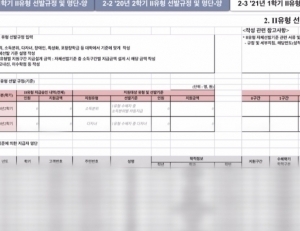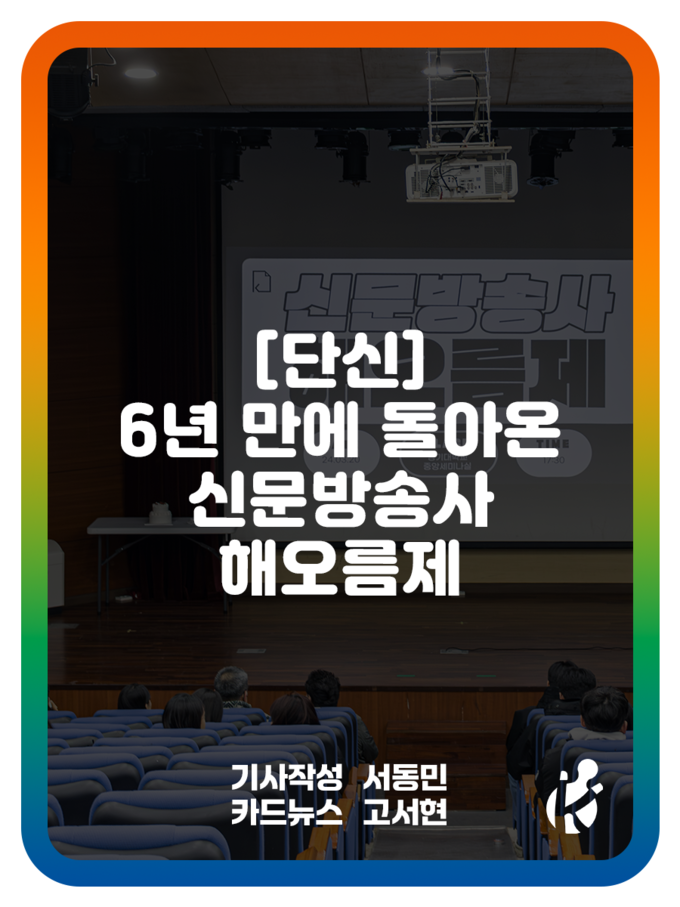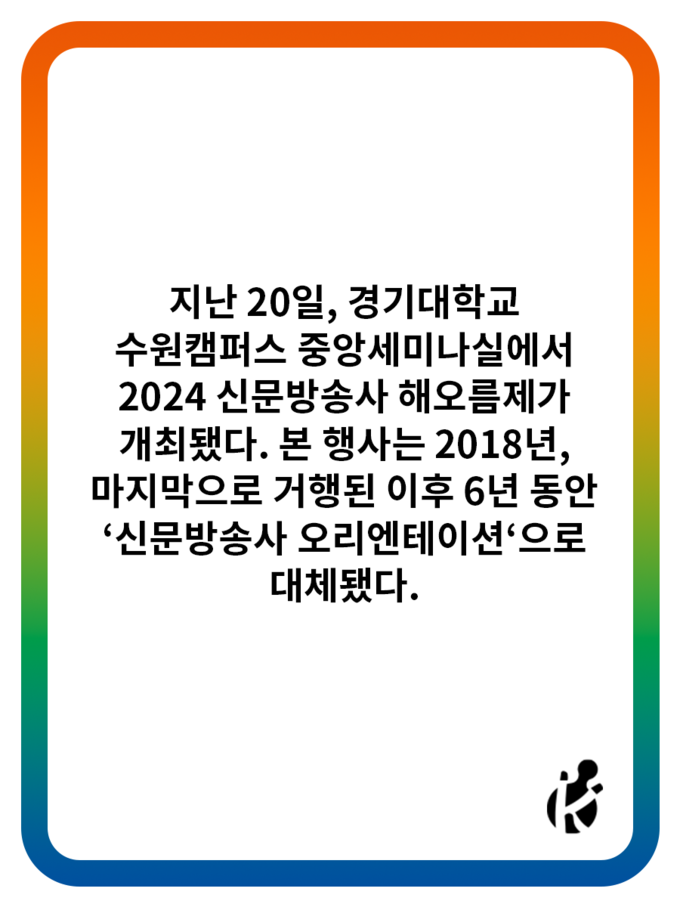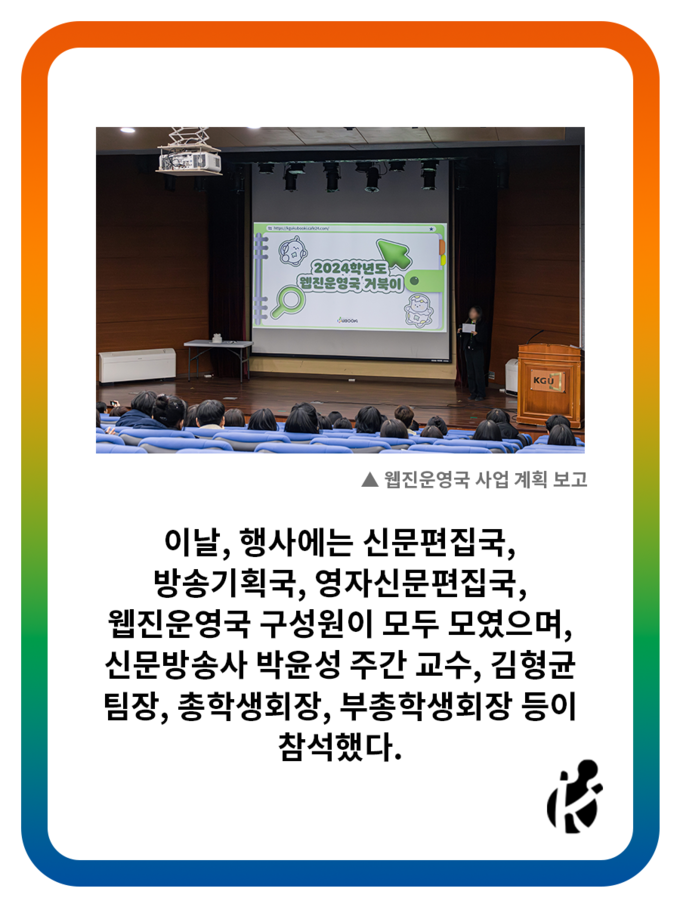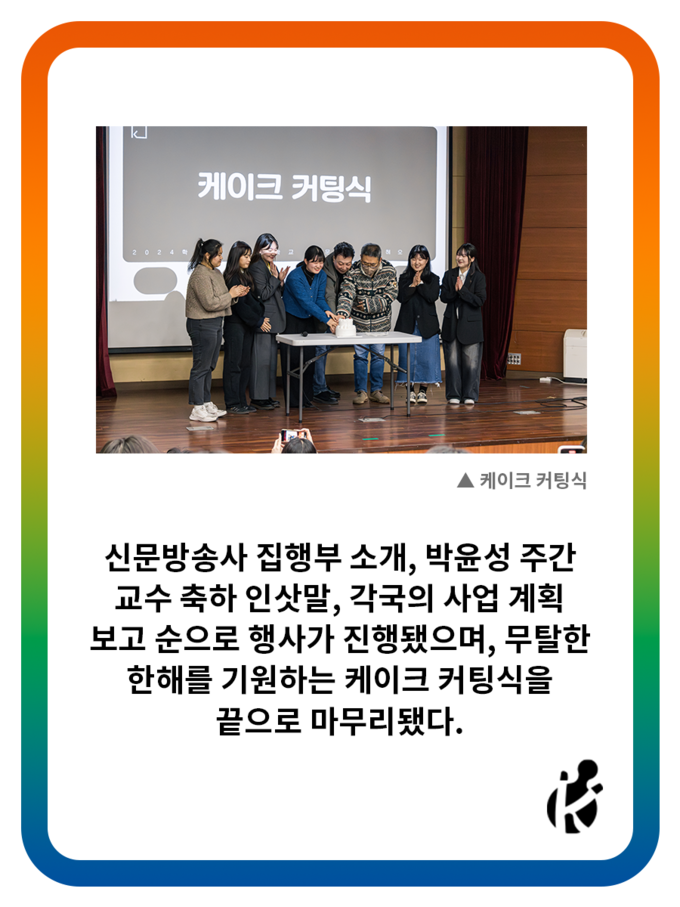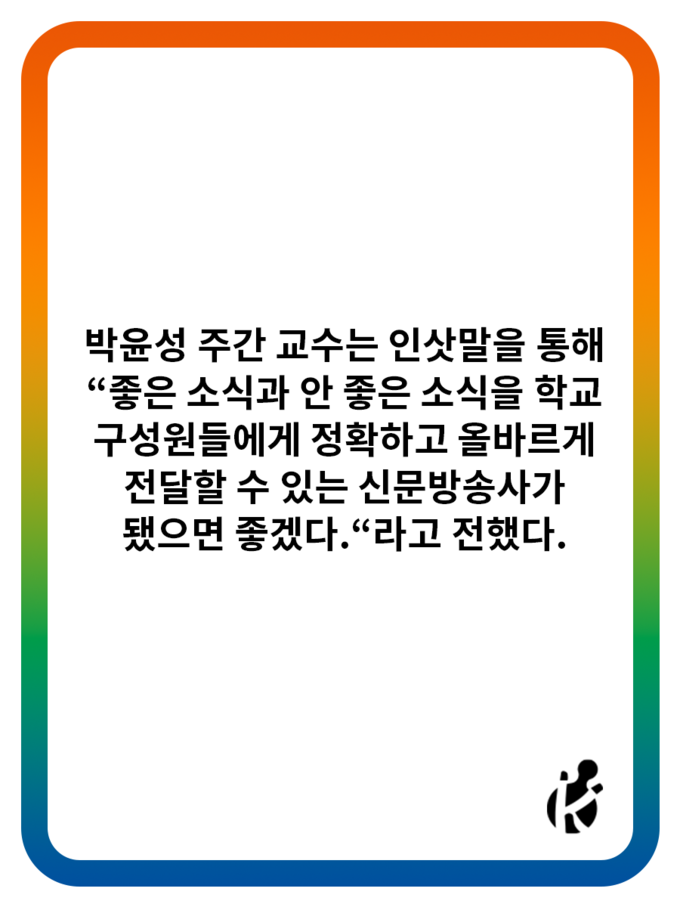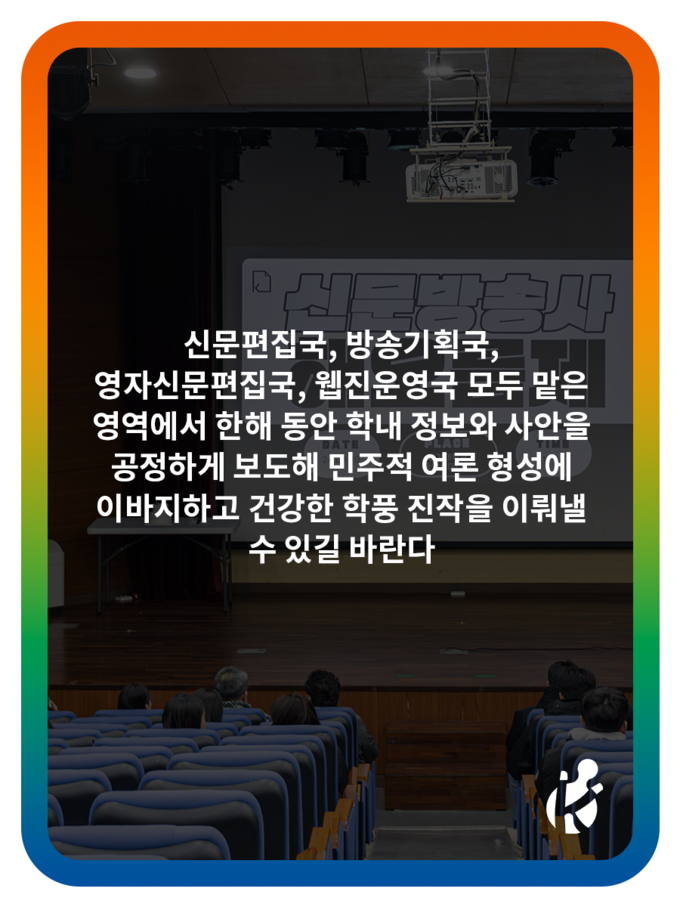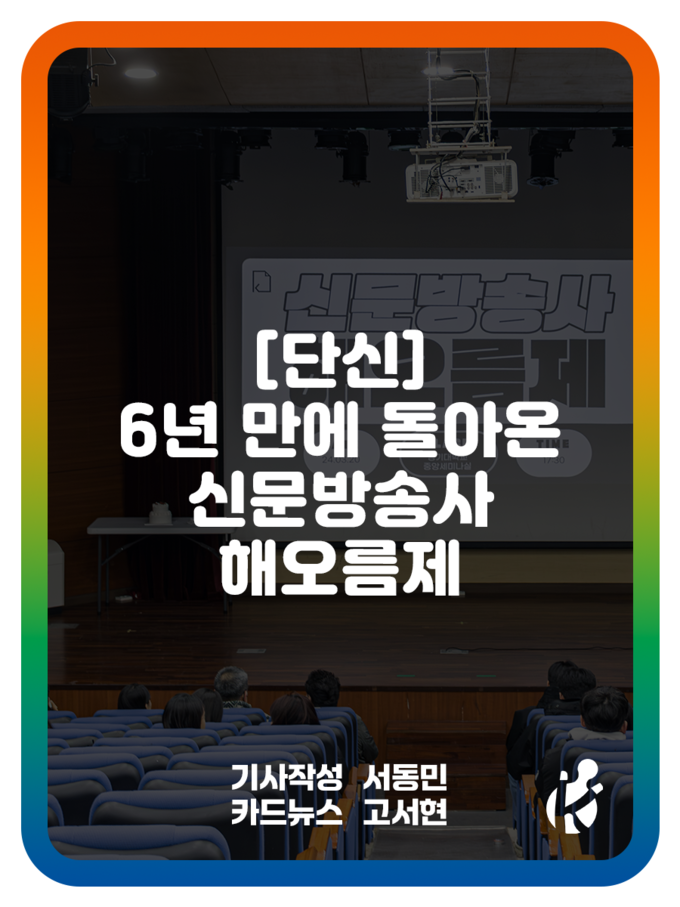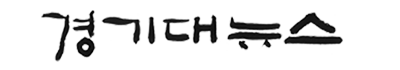음악은 100번을 부르면 100가지 버전이다. 아무리 똑같이 불러도, 정말 똑같은 버전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음악들은 ‘이 때 부른 게 가장 좋다’고 기억되는 버전이 하나씩은 있다. 영화 ‘위플래쉬’는 음악을 이 ‘순간’으로 정의한다.
긴 복도 끝, 홀로 드럼 연습에 몰두한 ‘앤드류’에게 다가가는 ‘플레처 교수’의 시점 쇼트로 시작한다. 2분 남짓의 강렬한 첫 만남 이후 며칠 뒤, 앤드류는 셰이퍼 최고 스튜디오 밴드의 보조 드러머로 발탁된다. 기쁨도 잠시, 악명 높은 지휘자 플레처 교수는 온갖 모멸적인 발언과 폭력으로 앤드류를 몰아붙인다. 그는 열 받았지만 드럼 앞에 앉는다. 메인을 넘어 최고의 연주자가 되기 위해 피가 터져 나오는 손을 끊임없이 테이핑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마지막 9분에 이르면 두 사람은 ‘Caravan’의 베스트 버전을 만들어낸다. 이어서 앤드류가 광기의 즉흥 솔로에 돌입하게 되면, 그 끝에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이내 씨익 웃으면서 음악과 함께 영화가 막을 내린다.
“요즘은 그런 게 대세니 재즈가 죽어갈 수밖에.
스타벅스의 소위 재즈 앨범 같은 것들이 모든 걸 말해주지.”
『위플래쉬』 中
재즈의 광팬인 감독은 작중 수차례 플레처 교수의 대사를 빌려 재즈의 몰락에 대해 한탄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작품의 개봉 이후 논쟁이 된 것은 교습법에 대한 옳고 그름이었다. 이는 감독이 직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재즈에 대한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지점이다. 정말로 한 연주자의 성공이나 교습법을 고발하고 싶었던 것이라면, 결말에 관객의 박수갈채가 결여돼서는 안됐다. 그렇다면 감독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누군가와 황홀한 하룻밤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 기억이 평생 가거나 어떤 사람과의 지적인 대화 10분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재즈는 그런 찰나의 음악이다. 즉흥연주의 근본인 재즈는 몇 가지의 약속된 패턴만 가진 채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애드리브를 맞추면서 느껴지는 잠깐의 희열로부터 시작돼 그곳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중 두 사람이 보여준 극한에서 만난 예술에 대한 교감, 그 순간을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연주자는 그걸로 된 것이다.
그 순간이 기록된 5분의 레코딩을 듣고 우리는 50년, 500년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산다.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라고 본다. 지금의 플레이어들이 열정이 부족해서 재즈가 망했다는 꾸중이 아니다. 만약 그 한 순간의 기적을 믿는 재즈 연주가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분명히 플레처 교수가 추구한 스파르타식 교육이 아니어도 연습은 계속될 것이고 앤드류같은 드러머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플레처 교수는 변명의 여지없는 악당이긴 하나 어쨌든 그 순간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다.
박선우 기자 Ι 202110242psw@kyonggi.ac.kr
- TAG
-
 What Happened in KGU? :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편
On April 4th, a general meeting of students was held in the Tele-convention center at the Suwon campus. The conten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meeting of students in the Seoul campus: the first part was for agenda announcement, the second part was about the Membership Training for whole university, and the third part was simple Q&A time. In the first part, the agendas were all the same as the ones for the Seoul campus, and the result of the ...
What Happened in KGU? :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편
On April 4th, a general meeting of students was held in the Tele-convention center at the Suwon campus. The conten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meeting of students in the Seoul campus: the first part was for agenda announcement, the second part was about the Membership Training for whole university, and the third part was simple Q&A time. In the first part, the agendas were all the same as the ones for the Seoul campus, and the result of the ...

 [타 대학보 축사] 경기대신문의 1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타 대학보 축사] 경기대신문의 11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이파이]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과대포장 규제 정책 시행은 언제쯤
[와이파이]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과대포장 규제 정책 시행은 언제쯤
 [문화산책] 이 세계는 멋져 보이지만 모두 환상이야
[문화산책] 이 세계는 멋져 보이지만 모두 환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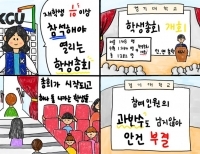 [네컷만화] 학생총회
[네컷만화] 학생총회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