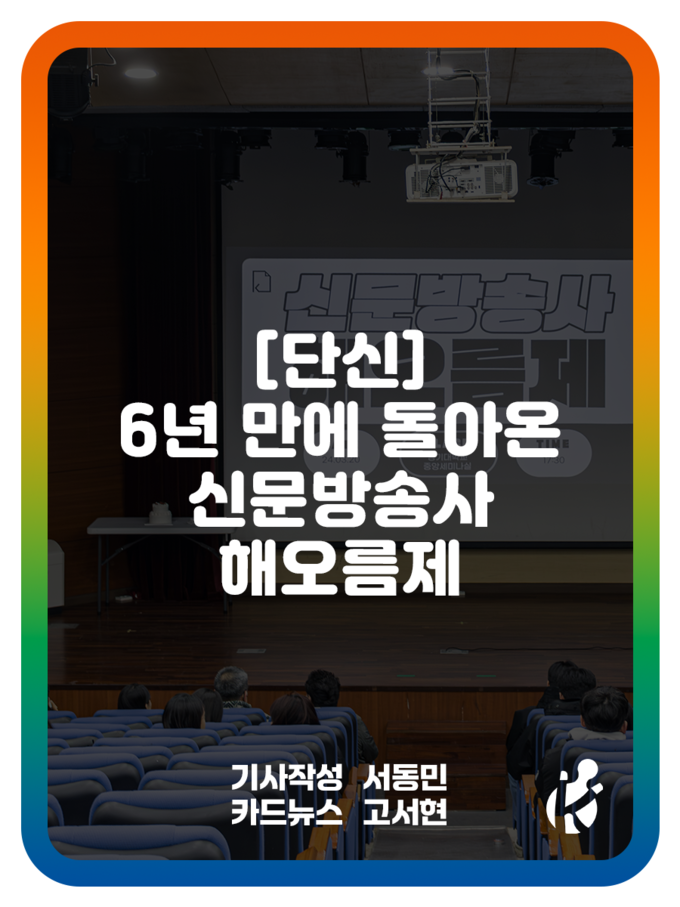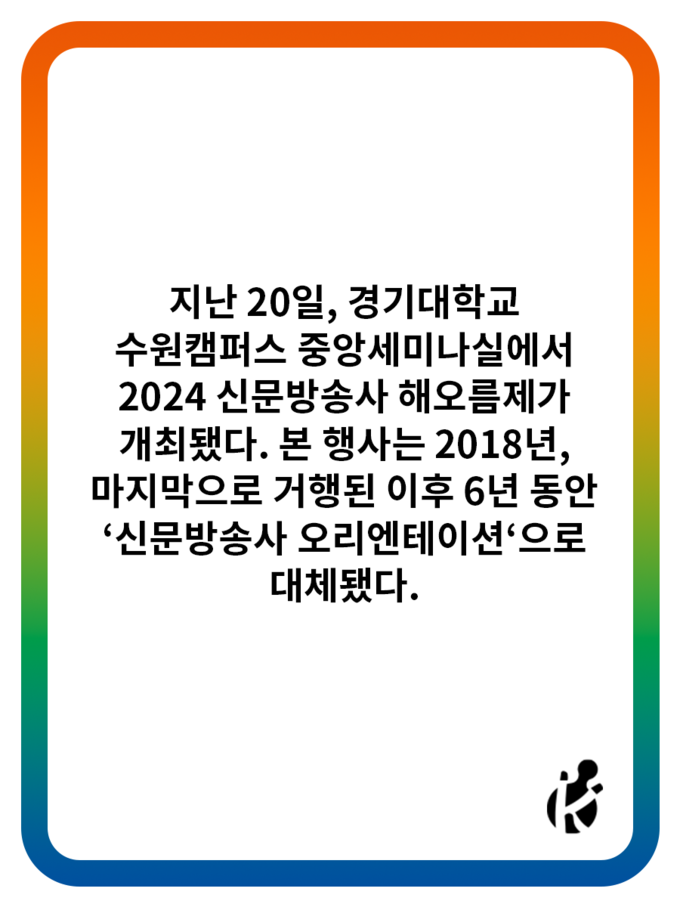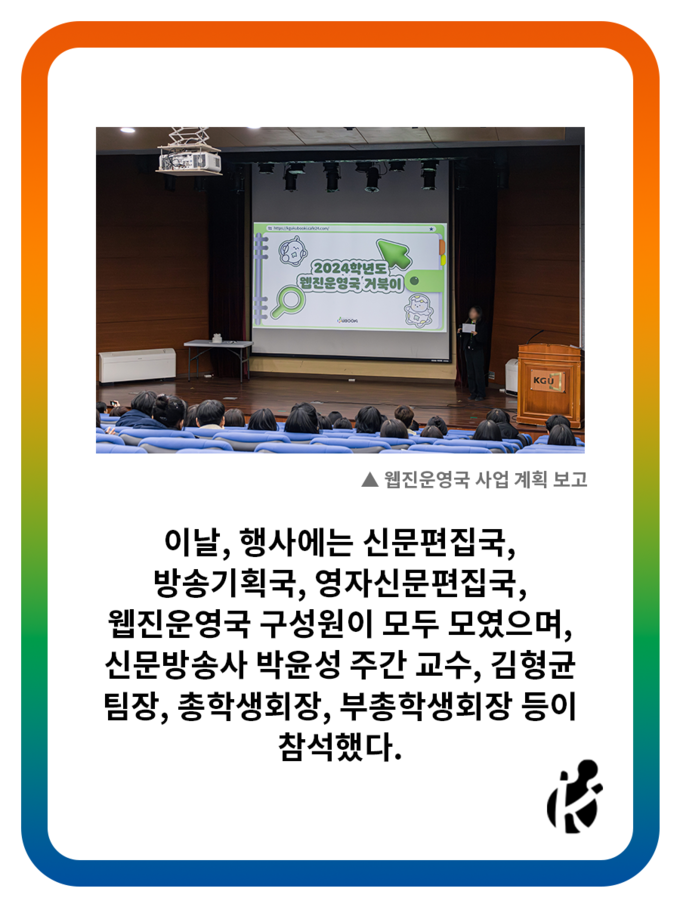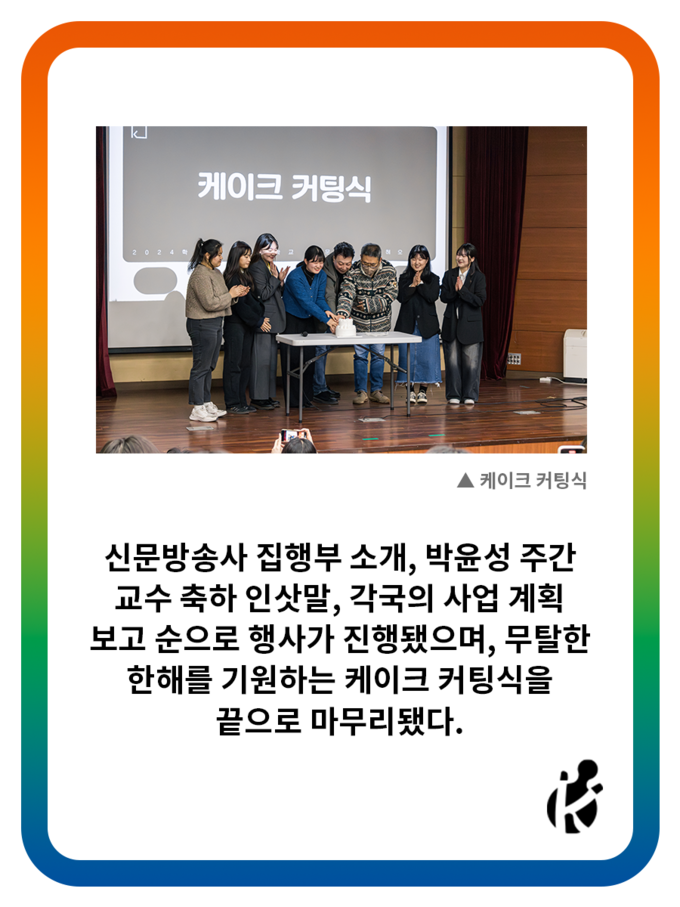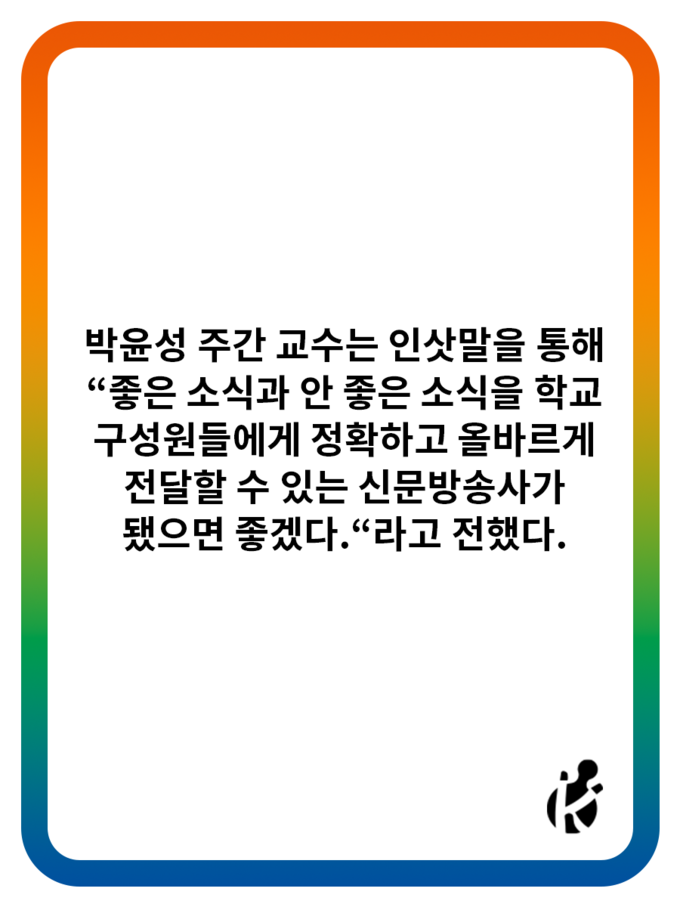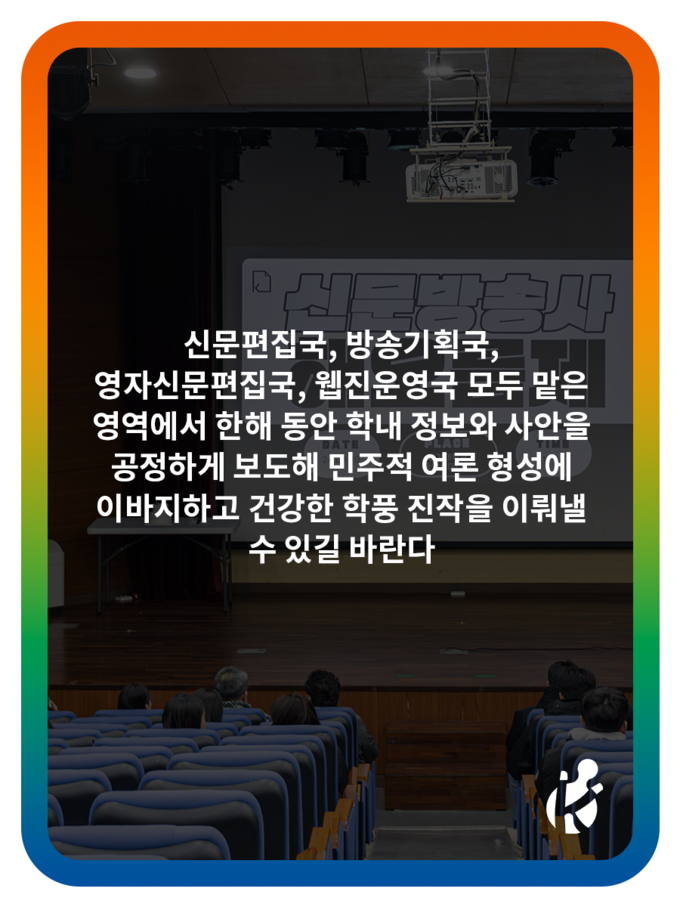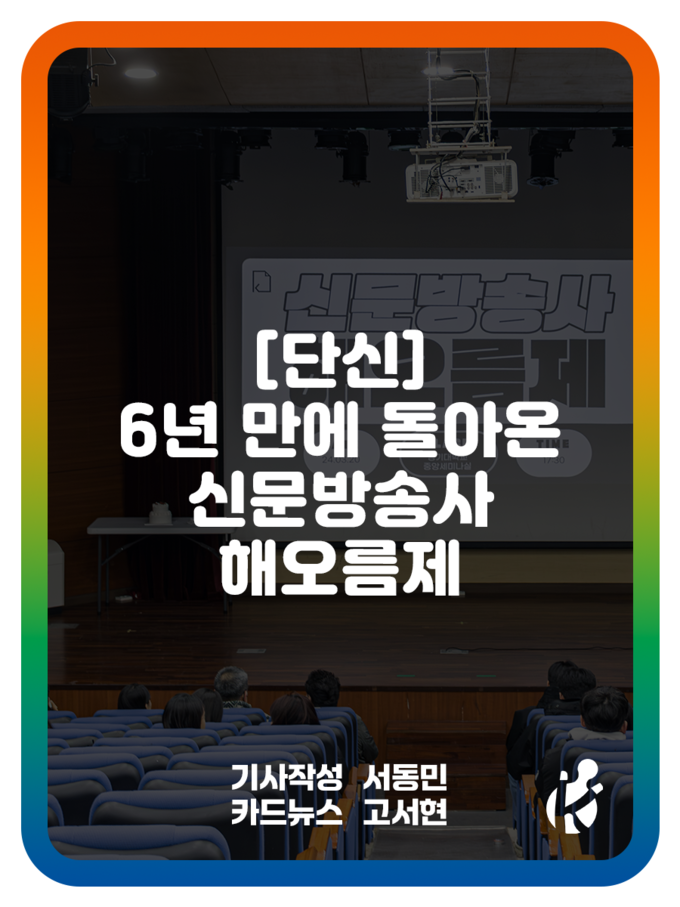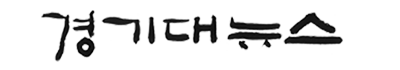교육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3년 이내에 38개의 사립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한다. 학령인구와
대학진학율은 점점 줄어들어 10년 후에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30만명대 초반이 될 것이고, 20년 후에는 20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2018년 대학정원이 55만명임을 고려하면 불과 10년 후에 대학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10년 이내에 절반에 가까운 대학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특히 우리학교처럼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은 그 위험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다행히 우리학교는 올해 교육부의 대학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매년 50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게
됐다. 학교의 구조를 바꿀 재정과 3년의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대학본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앞으로 우리학교의 미래를 담보할 분야를 특성화하겠다고 한다. 김인규 총장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한류특성화와 국제화가 그것이다. 최근에는 북한 관련이나 스포츠외교 전문가 양성, 4차 산업관련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특성화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특성화 논의가 일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구성원들이 느끼는 특성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지난 7월말 불과 수일간의 시간을 주고 각 학과 교수들에게 특성화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한다. 교무회의에 각 단과대학의 특성화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8월에 취합하여 9월중에 선정한다는 말도 있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말도 있다.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방향 없어 보임이 대학구성원들이 특성화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이유 중의 하나다.
특성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대학본부가 먼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과의 소통, 공감이 필요하다. 이어 성과를
제시해 자긍심과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지금 대학본부가 특성화를 추진하는 방식이 과연 그러한지 묻고 싶다.
대학은 능동적인 소프트웨어 조직이다. 누가 하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일에 남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고, 커다란 진전이 있을 수도 없다. 능동적인 소프트웨어는 소통을 통해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능동의 힘이 발휘될 때 특성화는 성공할 것이고, 그 성과는 배가될 것이다. 능동적인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위해선 행정당국의 유연한 규정적용과 도움이 필수불가결하다.
특성화 추진에 있어서 대학본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다.
특성화의 열매는 학생성공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이 입학 후 졸업까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만 한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적 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꿈을 가꾸어가게 해야 한다. 본교의 특성화도 학생성공이라는 대명제 하에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본교는 곧 갈림길에 서게 된다.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그저 그런 대학으로 남느냐 명실상부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학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문으로 도약하느냐, 그 첫 단추는 특성화에 의해 끼워질 것이다.
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의 보다 속 깊은 논의와 헌신을 촉구한다.
- TAG
-
 What Happened in KGU? :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편
On April 4th, a general meeting of students was held in the Tele-convention center at the Suwon campus. The conten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meeting of students in the Seoul campus: the first part was for agenda announcement, the second part was about the Membership Training for whole university, and the third part was simple Q&A time. In the first part, the agendas were all the same as the ones for the Seoul campus, and the result of the ...
What Happened in KGU? : 수원캠퍼스 학생총회 편
On April 4th, a general meeting of students was held in the Tele-convention center at the Suwon campus. The conten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meeting of students in the Seoul campus: the first part was for agenda announcement, the second part was about the Membership Training for whole university, and the third part was simple Q&A time. In the first part, the agendas were all the same as the ones for the Seoul campus, and the result of the ...

 [1100호 축사] 경기대 역사의 寶庫 경기대신문의 11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1100호 축사] 경기대 역사의 寶庫 경기대신문의 11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와이파이]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과대포장 규제 정책 시행은 언제쯤
[와이파이]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과대포장 규제 정책 시행은 언제쯤
 [문화산책] 이 세계는 멋져 보이지만 모두 환상이야
[문화산책] 이 세계는 멋져 보이지만 모두 환상이야
 [진리터] 1100호가 우리의 종착지는 아니니까
[진리터] 1100호가 우리의 종착지는 아니니까

 목록
목록